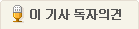|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다. 체온계를 빼는데 열에 들뜬 숨소리가 사막의 모래를 불러왔다. 어머니는 사막을 건너고 있는 낙타다. 힘겹게 고비 사막을 건너고 있다. 모래바람은 사정없이 온몸을 흔들고, 넘어야 할 언덕은 아직 멀기만 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바람이 발자국을 옮기는 사막의 시간은 견딤의 연속이다. 그 길을 횡단하는 동안 낙타는 첫배에 낳아 졸랑거리던 새끼를 잃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다. 남은 새끼들이 있고, 멀고 먼 거친 사막을 건너야 한다. 마침내 시간은 사막의 끝을 보여주었다. 지친 걸음도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다. 남은 새끼들과 이탈하지 않고 꿋꿋하게 바람의 길을 지나온 것이다.
어미는 사막의 열기를 온몸으로 버텨내느라 상처투성이다. 견딤의 흔적, 발바닥의 굳은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몸뚱이에서 쓸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새끼들이 곁에 있으니….
낙타는 다시 고비 사막에서 싸우고 있다. 패혈증이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고열. 꿈속에서 잃어버린 새끼를 찾아 헤매는 것 같다. 거친 모래폭풍의 한 가운데서 잃어버린 내 새끼. 큰 소리로 부르고 있나 보다. 두 손이 허공을 젓는다. 가슴 언저리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던 새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아, 어디 있니…. 서서히 숨결이 잦아들고 있다. 사막에서 놓친 새끼를 만났는지. 이제는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나 보다.
낙타의 의지는 고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간신히 눈을 떴다. 사흘 밤낮을 끊어질 듯 가쁜 숨소리를 내려놓지 않더니 발밑에서 흔들어대는 새끼들의 간절함을 알았나 보다. 링거에서 한 방울씩 사막에 깃들었던 물소리를 퍼 올린다. 가늠되지 않는 속도지만 물방울을 나르는 동안 고열의 심지가 꺾인 것이다. 낙타의 숨소리가 순해지고 있다. 무릎을 세우고 다시 새끼들과 길을 나설 생각을 하고 있겠지.
순간에 맞닥뜨리는 모래폭풍, 어머니의 몸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혼자 고비 사막을 넘으며 견뎌내는 걸 그저 지켜보았을 뿐. 후회와 안쓰러움으로 마음 졸이며 불효를 뼈저리게 느낀다. 별을 지고 모래폭풍을 견디며 앞만 보고 넘어가는 길, 그 고비를 함께 건너는 중이다.
어머니께 시 한 편 올린다.
태흙을 풀어 수비질*로 공을 들인다 연잎에 긋는 빗소리, 오후의 평수를 잘라내며 온힘을 쏟지. 연꽃향기가 허공을 치댄다. 개펄의 시간을 물레에 얹자 탯줄을 가르는 갯내음. 불꽃에 붙박이며 가마 쪽 일에 귀를 연다 애벌그릇 뜨겁게 끌어안을 때 화려한 꿈을 담으려던 너는 초번의 불꽃을 읽어내지 못했고 불완전한 숨결에 금이 갔다 담아야 할 자리를 잃어 무엇이 되지 못한 조각들을 내려다본다 몇 번의 불질에 몸을 맡겨야 너를 안을 수 있을까. 애벌의 살갗에 견뎌내는 사랑을 유약으로 바른다 덧난 상처를 안으로 삼켜 마침불꽃으로 단단해진 너를 확인했다 가마를 털자, 불새는 검붉은 문장을 지우며 날아간다. 불새가 날아간 자리, 연꽃무늬만 남았다 아가미로 호흡하던 기억은 잊은 채, 한 때는 차 우림 그릇이거나 술잔이거나 파도를 담은 너, 서해라고 부른다. -〈불새가 그린〉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