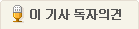<수필> 민원인이 최고의 고객입니다 - 김외숙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문학 아카데미 독서포럼 수강생 작품
<수필> 민원인이 최고의 고객입니다 - 김외숙 수필가(사)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문학 아카데미 독서포럼 수강생 작품
출근길 아침 멀쩡하던 자동차 트렁크가 움푹 패여 있다. 블랙박스 속 자동차는 지진을 만나듯 펄쩍 뛰면서 흔들린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공격한 차가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유무를 확인해보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주차장이 있으면 당연히 CCTV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애먼 관리실 직원한테 화를 냈다.
손톱만 한 칩을 들고 안산 D 경찰서 문을 두드렸다. 담당 경찰관은 수더분한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한 인상이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 내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던 충돌 장면도 잘 보인다. 역시 경찰서는 전문적이고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곳이라고 탄복했다. 그런데 무작정 들이박고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린 흰색 아벨라 승용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번호가 없으면 찾기 어렵단다. TV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뺑소니는 쉽게 찾더라고 했더니 그건 TV니까 그렇단다.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인데, 이 정도쯤이야 쉽게 해결하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 담당 경찰관의 명함에도 민원인이 최고의 고객입니다.’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뚜렷이 박혀있다.
한 달 후 ‘귀하의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S 지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허망했다. 날짜와 시간, 차종은 확인되었으니 가까운 교통 카메라 몇 군데 만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왠지 나에 대한 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수리비와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 달간 찌그러진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했다. 하지만 비가 오면 트렁크로 들어오는 빗물에 결국 공업사를 찾았다.
몇 년 전에는 차량 내 물품 도난으로 경찰서를 찾아간 적이 있다. 서울 S 경찰서였다. 잦은 건망증으로 차 트렁크에 키를 꽂아두었다가 귀중품을 잃어버렸다. 네비게이션. 선글라스, 현금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CCTV는 늦은 밤 젊은 남자가 몇 번씩 문짝을 열고 드나드는 행동과 얼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파트 여자 관리소장은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남자를 만나 보겠다고 했다. 젊은 청년의 앞날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둔 직장인으로 우리 집 위층에 살았다. 관리소장은 영상 화면을 보여주고 분실물을 돌려줄 것을 청했지만, 차 키를 꽂아 둔 사람의 잘못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 관리소장의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쩔 수 없이 육하원칙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나름대로 작성하여 관할 S 경찰서로 갔다. TV에서만 보던 경찰서의 쇠창살이 있는 강력계였다. 상사에게 결재를 상신하듯 조심스럽게 신고서를 내밀었다. 젊은 형사는 위엄 있는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리고 투박하게 질문했다.
“이거 누가 적었어요.”
“제가 요.”
무슨 의미로 묻는지 모르겠다. 겨우 이것밖에 못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뜻인지, 아줌마치고는 잘 적었다는 뜻인지, 뭘 이런 걸 쓸데없이 제출하느냐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도난 경위와 CCTV를 본 내용과 관리소장의 선행을 설명했다. 형사는 그 자리에서 관리소장한테 전화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왜 당신이 용의자를 먼저 만나느냐’며 호통을 쳤다. 그 권위에 주눅이 들고 카리스마에 압도당했다. 저 정도로 당당한 형사라면 내 귀중품을 꼭 찾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후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그 건은 그날 미결로 끝나버렸다.
내가 관공서를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지역 행정센터를 찾는 일을 제외하고는 서울 S 경찰서와 안산 D 경찰서가 전부였다. 두 곳 모두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흔히 말하는 빽(인맥)을 썼다면 해결이 되었을까. 병원과 경찰서 수위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정말 인맥이 없어서인지, 경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아니면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해결의 가치조차 못 느끼는지 궁금하다. 국가에서 받은 납세고지는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국가에 도움을 의뢰할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당한 기분이다. 괜히 신고했다는 후회도 되었다. 국가에 대한 실망만 가중 시킬 뿐이다.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공평할 수는 없듯이, 경찰이라고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의뢰하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고객 대우는 아니더라고 불가 사유는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해가 지날수록 불신의 벽만 두꺼워진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