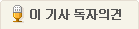꿈속에서 새를 날려 보냈다. 볕이 잘 드는 마루 한 끝에 걸린 새장 문을 열었다. 두 마리의 작은 새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 중의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열린 문 쪽으로 다가오더니 후두둑 날아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큰 새, 작은 새가 잇달아 날아갔다. 새장 문은 열려 있었고, 어디서 왔는지 새떼가 그 문으로 끝없이 날아가는 걸 보고 있었다. 꿈이었다. 눈을 뜨자, 나는 여전히 방안에 누워 있었다. 어제의 나의 집이었으며 눈에 익은 책과 책상과 함께였다. 끝내 날아가지 못한 것이다. 계절이 깊어지면서 새장의 문을 열어주는 꿈을 다시 꾼다. 날아갈 수 없는 자신에게 절망했던 스무 살의 기억처럼. 타성적인 삶에 대한 어설픈 도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生의 변화를 시도하며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날개가 부러지고 상처 입은 새가 되어 문이 닫힌 새장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은 어떤 무모함에서 오는 후회와 좌절을 감내할 각오 없이는 분명 한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도 바쁘다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지낸다. 일한 것의 질량을 돌아보면 우습도록 보잘 것 없는데도 분주함에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나를 밀어붙인다. 가슴 속은 더 바쁘다. 일렁이는 물이랑이 기슭으로 밀려와 쉼 없이 부서진다.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해안에 드러눕는 마음의 물결들. 결심한 일을 선명히 정리하고, 끝을 내려하지만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일어날 수가 없다. 흠씬 땀에 젖어 물 밑으로 가라앉은 기분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다. 신열과 갈증이 범벅이다.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엔딩 씬이 떠오른다. 동트는 여명을 향해 커다란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그. 검고 건장한 체구로, 병원의 출입문을 반쯤 막아서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인이다. 백치인 줄 알았던 그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와 용기를 숨기고 있었다.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한 날개로 꼭 필요한 때에 날아가기 위하여…. 어느 날 새벽, 그는 날아올랐다. 사람들이 고작 창문으로 탈출을 계획하던 그 견고한 돌집의 정문을 한 번에 부수고 창공으로 날아오른 것이다. 그는 새가 되었다. 원할 때 날 수 있는 완벽한 새가 된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소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꿈꾸는 삶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꿈을 품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 꿈이란 곧 뜻이다. 뜻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꿈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내게 있어 꿈은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였다. 문득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될, 판에 박힌 일상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미지의 것은 현재의 안정을 넘어 열정과 자극을 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감각과 허무감보다는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단단히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창공을 날고 싶은 욕구를 동시에 품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날아가고 싶은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